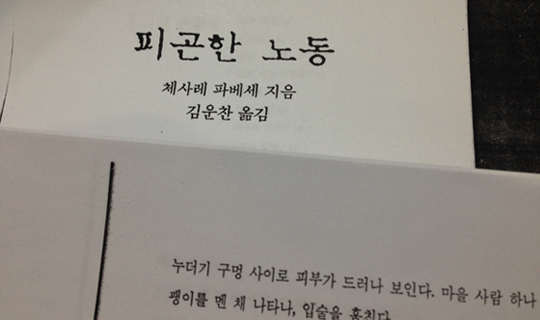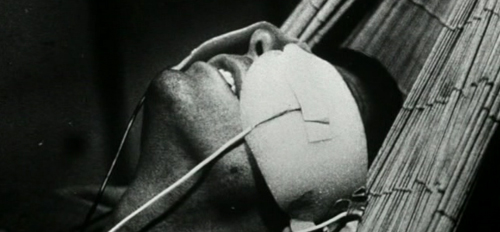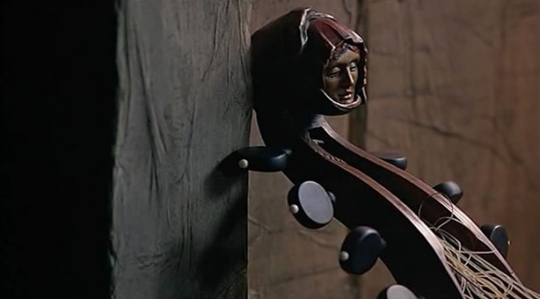Jonny Greenwood & Krzysztof Penderecki
(European Culture Congress 09/09/2011. Wroclaw, Poland)
Radiohead 때문에 Penderecki를 알게 되었다. 기타리스트 Jonny Greenwood는 오래 전부터 그가 영향을 받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펜데레츠키를 언급해 왔다. 조니가 만든 <There Will Be Blood> 사운드트랙은 마치 펜데레츠키에 대한 오마주처럼 느껴질 정도. 결국 조니는 오랜 동경의 대상 펜데레츠키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물은 [Krzysztof Penderecki / Jonny Greenwood]라는 이름의 음반으로 2012년에 발매되었다.
http://www.bbc.co.uk/programmes/p00qg018
음반이 나왔을 때, BBC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했던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스탠리 큐브릭이 펜데레츠키에게 <샤이닝>을 위한 음악을 부탁했던 일, 조니가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할 때, 처음 펜데레츠키의 음악(‘Threnody for the Victims of Hiroshima’)을 접했던 에피소드 등이 소개된다. 펜데레츠키는 손녀의 소개로 Radiohead 음악을 처음 듣게 되었다고.
펜데레츠키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Radiohead 곡이 있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조니는 ‘How to Disappear Completely’와 ‘Climbing Up The Walls’을 예로 든다. 이제 다시 들어보니, 두 곡에 사용된 현악 연주에서 확실히 펜데레츠키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이 느껴지는 듯. 인터뷰 끝부분에서 펜데레츠키는 조니 개인과의 협업을 넘어 ‘밴드’ Radiohead와의 작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슬쩍 언급하는 데, 이거 참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12.20.
펜데레츠키가 직접 지휘한, ‘예루살렘 7개의 성문’ 국내 초연에 다녀오다-
Read More